우리네 어머니 이야기 <엄마 나 또 올게>-홍영녀, 황안나
우리네 어머니 이야기 <엄마 나 또 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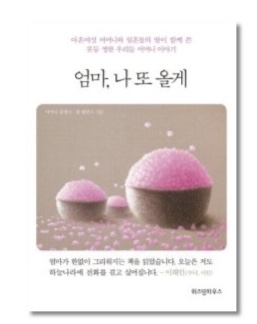
창밖에 부는 바람,
죽음의 신음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숨소리도 거쳐 왔을 것이다.
잠 못 이루는 이 밤,
바람에게 많은 사연을 듣는다.
어떠세요? 참 많은 여유를 남기지 않나요? 짧은 시이지만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저 시원하다고만 느끼는 바람에게서 죽음과 탄생의 깨달음이 절묘하게 들어 있습니다. 왠지 지금 나를 지나가는 바람이 어떤 세상을 돌다가 나에게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가 듣고 싶게 합니다.
이 시는 70세가 넘어서 손자가 공부하는 어깨너머로 한글을 깨치게 된 할머니가 틈틈이 노트에 적은 글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팔순을 앞두고 우연히 큰 딸이 8권 분량으로 쓴 엄마의 노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팔순 기념으로 한 권의 책을 엮었는데 이 책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으면서 KBS <인간극장>에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큰 딸 역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도보여행가로 제2의 삶을 연 ‘황안나’할머니입니다. 일흔이 넘었으니 할머니라는 호칭이 자연스럽지만 이 분에게는 망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도보로 완주할 정도로 나이를 잊고 삽니다. 특히 이 여정을 쓴 책이 <내 나이가 어때서?>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 다리에만 의지해서 인도 네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등 여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책은 그 후 아흔여섯에 떠난 어머니와 일흔둘의 딸이 함께 쓰는 이야기입니다.
홍영녀 할머니가 쓴 글을 읽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글이 과연 70이 넘어 한글을 처음 배우셨다는 분이 맞을까?’ 할 정도로 표현이 섬세하고 뛰어납니다. 글을 배워야만 잘 쓴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할머니는 90이 넘어 쓰러지기 직전까지 호미를 들고 밭을 갈고 자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농사철에는 혼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긴긴밤 자식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그리워합니다. 자유로워지려면 외로움도 견뎌야 한다는 할머니가 긴긴밤 잠 못 들고 써 내려간 진솔한 글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울림이 전해집니다. 또한 글은 평생 슬픔과 고통을 다스리며 삶을 껴안아왔기에 그 자리마다 진주처럼 맺힌 속울음 방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
자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쓸쓸한 마음이 눈 녹듯이 스러지고 살 의욕이 샘솟는다.
그러나 자식들의 찬바람은 피가 마르는 듯 야속하고 가슴엔 피멍이 드는 것 같다.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보다 천 배 만 배 더 야속하게 느껴진다.(237p)
엄마와 딸이면서도 같은 여자라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일까요? 자식에게 주려고 힘든 농사일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몸 아끼지 않는 엄마에게 화를 내는 홍안나 할머니처럼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금방 뒤돌아서서 후회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책을 읽는 동안 두 분의 모습을 통해 나의 엄마 얼굴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딸이 온다는 연락에 반가우면서도 이틀 뒤 떠날 생각을 하면 벌써 슬퍼진다는 글을 읽으며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고 몸이 아프면서도 자식 걱정할까 봐 숨기는 모습에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전화 한 통화에도 반가워하는 모습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딸 노릇하기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거창한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보다 전화 한 통 더 자주 하고 지금보다 더 자주 만나러 가고 지금보다 더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한다면 우리네 엄마는 ‘또 올게’ ‘또 전화할게’라는 말에 기대어 평생 자식만 기다리다 가시지는 않겠지요? 나중에 덜 후회하도록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야겠습니다.
'리뷰 >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글쓰기가 만만해지는 하루 10분 메모 글쓰기 <이윤영> - 글 재료 모으기 (0) | 2021.03.29 |
|---|---|
| 오늘도 집순이로 알차게 살았습니다 <삼각커피> - 우리를 지탱하는 일상의 힘 (3) | 2021.03.26 |
| 무슨 가족이 그래? <고령화 가족> 천명관 (0) | 2021.03.14 |
| 손정의 아이디어 만드는 방법 (0) | 2021.03.13 |
|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마틴 피스토리우스 , 메건 로이드 데이비스 지음 (0) | 2021.03.12 |